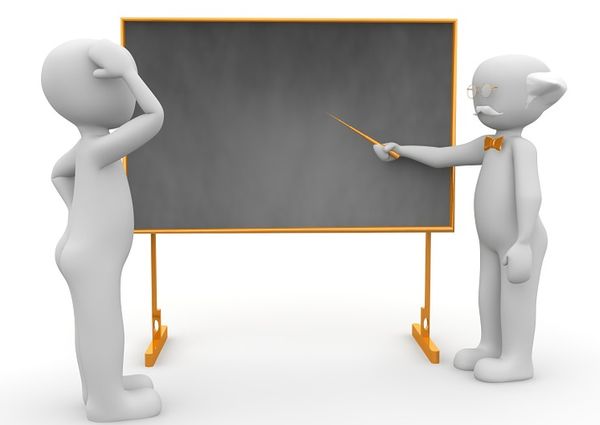
[뉴스인] 허영훈 기자 = 한 대학교수가 예의 없이 과제를 제출한 학생들에게 감점처리를 하겠다고 한 게시글을 두고 최근 네티즌들 사이에서 뒤늦은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해당 교수는 지난 2012년 자신의 SNS 계정에 글을 하나 올렸다. “UCC 과제물을 받았는데 간단한 인사말조차 없이 첨부파일만 덜렁 보낸 학생들이 꽤 있다. 이를 모두 감점 처리한다”는 내용이었다. “의학지식 백 개보다 사람 되는 예절 한 개가 훨씬 중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갑론’의 주장은 교수가 밝힌 ‘예절’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학생들 입장인 ‘을박’의 주장에는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원칙’이고, ‘메일의 기능적 특성을 간과’했으며, ‘평가의 기준은 과제물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잣대는 이러한 갑론과 을박 중 누구 손을 들어줄까? 이 문제는 ‘맞다’와 ‘맞지 않다’의 문제가 아니라 ‘옳다’와 ‘옳지 않다’의 문제로 봐야 한다. 학생들이 제시한 ‘맞지 않다’의 근거는 사실 대부분 타당하다. ‘평가의 기준’으로만 보면 그렇다. 그러나 평가 전에 선행되어야 할 ‘소통’의 원칙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그 원칙은 미리 정해지거나 정해진 것으로만 지켜져야 하는 문제는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어도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사례가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그것이다. ‘폭행죄’가 대표적이다. 이 경우 가해자는 법원칙에 의하면 무죄다. 그러면 더 이상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다. 옳지 않은 행동에 대한 ‘법감정’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을박의 중심인 해당 학생들의 행위를 ‘죄’에 비유하는 것은 물론 무리가 있다.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다만, 과제를 접수한 교수가 불쾌한 감정을 느꼈는지 여부를 떠나 사회적 관계 속 소통에는 보이지 않는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의’이다. 그 절차인 ‘예절’을 무시했다는 비판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이메일은 예절이 없어도 되는 소통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 보내고 받는 수단은 인간이 아닌 인터넷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보내고 받는 주체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직접 얼굴을 보고 과제를 제출했냐와 관계없이 인간과 인간의 소통에는 예절이 우선되어야 하며, 예절을 지키는 것을 우리는 ‘옳다’고 말한다.
해당 교수 역시 소통의 예절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조치보다 현명한 대처가 먼저 필요했다. 을박의 공분을 사기보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조언이 먼저다. “학생의 과제는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메일도 소통의 일부이니 다음부터는 인사말과 더불어 과제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좋으니 본문에 몇 자 적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인사말이 없으면 감점할 수도 있습니다”하며 그 다음에 웃음표시(^^)를 붙였으면 어땠을까 싶다.
이 교수가 한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 “의학지식 백 개보다 사람 되는 예절 한 개가 훨씬 중요하다.” 백 번, 천 번 옳은 말이다. 좋은 것보다는 옳은 것을 배우는 데 더 힘쓰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